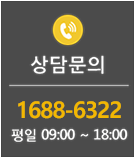쓰레기 줍기 수업·과일가게 선생님 있는 이 학교
지방 작은 도시 출신인 나와 서울 토박이인 남편이 만나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경기도 용인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호기롭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외롭기 그지없었지만,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자만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다.
친정도 시댁도 멀었던 나는 아이를 오롯이 혼자 키워야만 할 게 뻔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육아공동체였다. 육아공동체를 통해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과 도와가며 아이들을 길렀다.
동네 초입에 앉아서 아이들과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며 놀았다. 텃밭을 가꾸고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교사가 됐다. 서툰 솜씨로 상추며 오이며 방울토마토를
심고 있으면 지나가던 동네 베테랑 분들이 심는 법과 키우는 법을 가르쳐줬다. 멋들어진 통나무집에 사는 할머니는 당신 집 텃밭에 초대해 줬고, 교회 할머니는
6.25 전쟁 통에 일어난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 줬다.
아이들과 매주 화요일, 작은 집게와 바구니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논밭이 계절마다 변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우리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찰했다.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에게 고깃집 사장님은 기특하다며 사이다를 건네줬고, 마을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기도 했다.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마을이라는 학교를 다니며 만나는 이들 모두가 선생님이 됐다.
마을 학교 선생님은 동네 주민
일주일에 한 번 서는 동네 장에 오는 과일가게 아저씨도 아파트 단지 내 환경미화 할머니도 모두 삶을 나누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마을과 함께 자랐다.
마을에서 많은 것을 얻으며 자란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다.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며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해보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복지관에서 새로운 의미의 마을을 만났다.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하기 위해 모여 돌봄을 실천했다. 세대 차이가 꽤 났지만 서로를 존중했다. 대화가 잘 통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은 또 다른 경험을 했다. 캠페인을 열기도 하고, 줍깅(걷거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다녀왔다. 아이들을 위한 하모니카 연주회도
열렸다. 나눔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나눔을 배웠다.
내가 마을에서 바라는 건 거창한게 아니다. 혼자 걸어가는 아이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인사 해주는 것. 산책 중인 강아지에게 아는 척 한번 해 주는 거다. 트로트를 틀고
보조기에 의지해 걷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건넨 친근한 말 한마디가 마을의 기운, 우리 삶의 기운을 바꾼다.
그런 마을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출처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7677 )